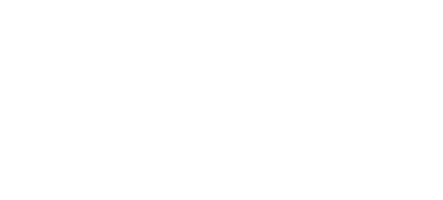국가미래전략원 미·중 관계 TF 보고서 발간
• 출간일 2024-11-20
• 조회수 2517
• 관련 연구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국가미래전략원 <미·중관계 TF>
『Towards Co-Resilience: W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Do Togethe r in an Era of U.S.-China Rivalry (공동 회복력(Co-Resilience)을 향하여: 미·중 경쟁 시대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이고 대내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United States, U.S.)과 한국(Republic of Korea, ROK)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스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위험과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도전이 발생할 때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공동 대응 및 복원력(a collective capacity for rapid recovery)”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한국(ROK), 그리고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은 잠재적 공격국의 강압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공급망, 첨단기술 클러스터, 군사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 교통로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중 네트워크의 취약성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대에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한·미 조선산업 동맹(U.S.-ROK Shipbuilding Alliance)’과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Altasia)’ 등의 구상을 통해 한국과 협력하여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다자 인공지능 연구소(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MARI)”를 설립하고, 현재의 칩4(CHIP-4) 동맹을 동맹국 간 통합적 협력 체계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핵심기술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해양 질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및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양국은 군사력 또는 강압적 수단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지역 유지체계(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RS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주기를 단축시키고 더 많은 방위산업 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일본, 호주, 그리고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다자 해양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 및 일본과의 전략적 협의를 제도화하고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과 병행하여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한국의 저농축우라늄(low-level uranium enrichment)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spent fuel reprocessing)”를 승인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양국이 제3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공동으로 수출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다영역 통합억제(multi-domain 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워싱턴은 나토(NATO)의 핵공유(nuclear-sharing) 모델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대통령 성명(Presidential Statements) 및 국가안보회의(NSC)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제어
미·중 전략경쟁, 다중 네트워크, 총체적 접근, 공급망 회복력, 한·미 조선산업 동맹, 경제안보, 첨단기술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안보 협력, 저농축 우라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북한 비핵화, 원자력협정, 확장억제, 다영역 통합억제

『Towards Co-Resilience: W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Do Togethe r in an Era of U.S.-China Rivalry (공동 회복력(Co-Resilience)을 향하여: 미·중 경쟁 시대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이고 대내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United States, U.S.)과 한국(Republic of Korea, ROK)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스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위험과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도전이 발생할 때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공동 대응 및 복원력(a collective capacity for rapid recovery)”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한국(ROK), 그리고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은 잠재적 공격국의 강압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공급망, 첨단기술 클러스터, 군사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 교통로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중 네트워크의 취약성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대에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한·미 조선산업 동맹(U.S.-ROK Shipbuilding Alliance)’과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Altasia)’ 등의 구상을 통해 한국과 협력하여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다자 인공지능 연구소(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MARI)”를 설립하고, 현재의 칩4(CHIP-4) 동맹을 동맹국 간 통합적 협력 체계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핵심기술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해양 질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및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양국은 군사력 또는 강압적 수단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지역 유지체계(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RS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주기를 단축시키고 더 많은 방위산업 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일본, 호주, 그리고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다자 해양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 및 일본과의 전략적 협의를 제도화하고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과 병행하여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한국의 저농축우라늄(low-level uranium enrichment)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spent fuel reprocessing)”를 승인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양국이 제3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공동으로 수출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다영역 통합억제(multi-domain 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워싱턴은 나토(NATO)의 핵공유(nuclear-sharing) 모델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대통령 성명(Presidential Statements) 및 국가안보회의(NSC)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제어
미·중 전략경쟁, 다중 네트워크, 총체적 접근, 공급망 회복력, 한·미 조선산업 동맹, 경제안보, 첨단기술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안보 협력, 저농축 우라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북한 비핵화, 원자력협정, 확장억제, 다영역 통합억제